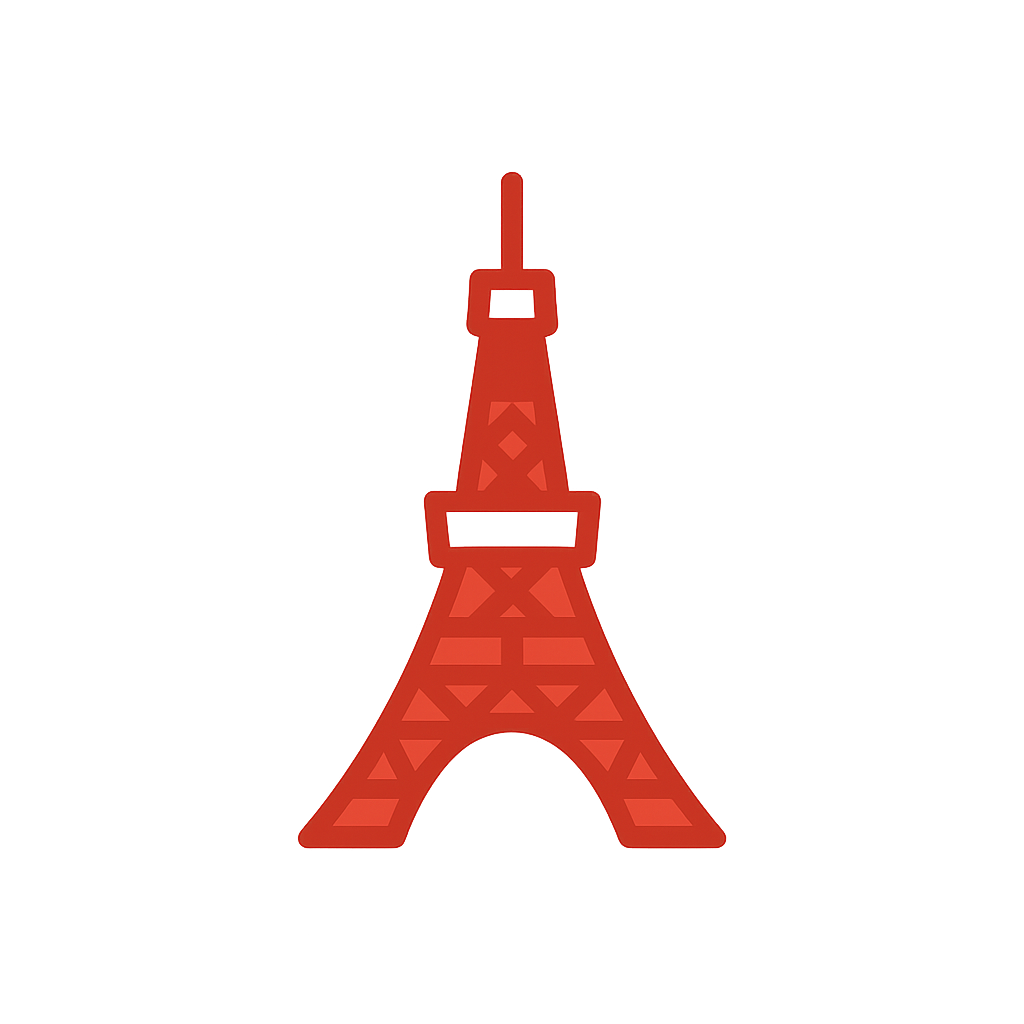始める前に
- 本記事は「言語学な人々 Annex Advent Calendar 2024」の12月23日分として書きました。詳しい内容は以下のリンクをご覧ください。
- 本記事は2022年学部生のころ発表した資料を元に書いたものです。
- 非母語話者であるため、母語である韓国語の資料を元にしています。なるべく日本語を考えて訳していますが日本語には当てはまらない内容があるかも知れ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
- ChatGPTを活用して翻訳しました。
- 研究者でないため、厳密には間違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ご指摘お願いします。
言語学な人々 Annex Advent Calendar 2024 - Adventar
**こちらは別館です。[本館はこちら](https://adventar.org/calendars/10429/)。** --- 言語学をやっている,言語学が好き,言語が好き,言語に興味がある人達が言語に関する何かを書きます([21年に書
adventar.org
0. 合成性の原理(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構成性とも言う。
私たちは言語を通じて意思疎通を図る。初めて聞いた文であっても理解ができ、また話すこともできる。
では、限られた単語で無限に近い意味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のはなぜだろう。
その理由は、意味の合成性にある。
単語と単語を組み合わせて意味を伝えるのである。
このとき、組み合わされた単語の意味は、それぞれの単語の意味を足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のが、合成性の原理である。
一見すると納得できるこの原理だが、本当にそうであろうか。
単語と単語を組み合わせても、それぞれの単語の意味を超えた新しい意味を持つことはないのであろうか。
例えば、「馬の骨」という表現。
もちろん、文字通り「馬」の「骨」を意味する場合もある。しかし、慣用的に「馬の骨」とは、「素性がわからない人」や「特に優れたところがない人」を意味する。
「矛盾」という単語はどうだろう。
論理が一致しないことを「矛盾」と表現する。しかし、「矛」と「盾」はそれぞれ「槍」と「盾」を意味する。意味を生み出す由来になってはいたかも知れないが、意味そのものに「槍」と「盾」の意味は込められてない。
このように、意味の合成性が破られる場合がある。このような言葉を「慣用表現」と言う。
1. 慣用表現の範囲
前述した「慣用表現」という言葉は、実際にはその用語や範囲が研究によって異なったりする。熟語・慣用句・イディオムといった様々な用語が存在し、それぞれの定義や含まれる範囲は研究によって異なる。
今回の投稿では、熟語やことわざなどを含めて、広く「慣用表現」という言葉を使うことにした。
さて、慣用表現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含まれるだろうか。
狭義の慣用表現
まず、狭い意味では以下のものが含まれる。
- ことわざ
- 隣の芝生は青い
- 噂をすれば影が差す
- 熟語(慣用句としての)
- 道草を食う
- 油を売る
- 四字熟語
- 一石二鳥
- 四面楚歌
広義の慣用表現
広い意味だと、以下のようなものが含まれる。
- 挨拶表現
- 「こんにちは」=「今日+は」
- 間接発話表現
- 「寒くない?」=窓を閉めてほしい(冬の場合)、エアコンを止めてほしい(夏の場合)
- 婉曲表現
- 「お花摘みに行ってきます」=トイレに行ってきます。
- 非論理的な表現
- 「バカ頭いい」=すごく頭がいい(静岡の方言)
2. コロケーションとの違い
コロケーション(collocation)とは
単語の中には、特定の結びつきで使われるものが存在する。
例えば、「年齢」という単語は「高い」と「上」という単語と結びついてそれぞれ「年齢が高い」、「年齢が上」と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年」の場合、「年が上」とは表現できるが「年が高い」はできない。
コロケーションと慣用表現の違い
このように、コロケーションは単語が結びついて表現することで慣用表現と似ているが、違いがある。
文脈と結びついて全く別の意味が潜んでいる場合を除いて、一般的に「年齢が高い」という表現は文字通り「年齢」が「高い」を意味する。
一方、「猫を被る」は本当に「猫」を「被る」ことではない。
3. 慣用表現の分類
統語的区分
文は句と節に分けられることは英語の授業で学んだことがある。同じように慣用表現も以下のよう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日本語の例だけでは慣用表現という感覚が薄れると思い、ルーマニア語の例も追加した。
- 単語:慣用語
- 「昼夜」 = 四六時中
- 「Calea-laptelui」(ミルクの道)=天の川
- 句:慣用句(一般的には慣用表現全体を表現することが多い)
- 「井の中の蛙」
- 「obraz de scoarță」(木の皮のような顔)=鉄面皮
- 節:慣用節
- 「ca și cum ai lua bomboana unui copil」(子どもからキャンディを取るように)=非常に簡単
- 文:慣用文
- 「風が吹けば桶屋が儲かる」
- 「Cine vrea miezul, să spargă nuca.」(中身が欲しい者はクルミを割らなければならない)=努力なくして何も得られない
- ことわざが多い
透明度(Semantic transparency)
慣用表現の意味が各単語の意味の結びつきからどれだけ離れているかによって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
- 慣用表現でないもの
- 「a bea cafea」(飲む+コーヒー)=コーヒーを飲む
- 透明度が高い
- 口を揃える
- 「a avea ochi roși ca de iepure」(ウサギのように赤い目を持つ)=酒に酔って目が赤くなる
- 各単語の意味から大きく離れておらず、初めて聞いてもその意味を理解しやすい。
- 比喩が直接的であることが多い。(直喩)
- 透明度が低い
- 目が肥える
- 「a se simți cu musca pe căciulă」(帽子の上に止まったハエを感じる)=良心の呵責を感じる
- 各単語の意味から大きく離れており、初めて聞いたときはその意味を理解しにくい。
- 間接的な比喩が多い(隠喩)
4. 慣用表現の特徴
慣用表現には、次のような特徴を持つものが多い。ただし、すべての慣用表現が次のような特徴を持つわけであはない。
意味の曖昧性
間に立つ
- 間に立つ(物理的に)
- 仲介する
このように「間に立つ」という表現は、「彼は田中と佐藤の間に立って肩を組んだ」のように物理的に「間」のことろに「立つ」ことを意味することもできる。
以下は、意味の曖昧性を活用したルーマニアのネットユーモアである。


左側
într-o ureche(片方の耳で)=狂う、気が狂う
- 「片方の耳だけあればマスクをしないでください。」
- 「あなたが狂っているなら、マスクをしないでください。」
右側
ca nuca în perete(壁にぶつかったクルミのように)=不適切である、場違いである
- 「あなたが壁にぶつかったクルミのように運転する瞬間」
- 「あなたが不適切に運転する瞬間」
意味的固定性
慣用表現を構成する単語を他の同義語や類義語に置き換えると、意味が失われるのである。
例えば、「白い目で見る」を「白い視線で見る」や「黒い目で見る」というと本来の意味を失う。
- 白い目で見る =悪意のこもった目で見る
- 白い視線で見る
- 黒い目で見る
このような特徴は、慣用表現であるかを確認する方法として使われる。
例えば、コロケーションである「背が高い」で「背」を「身長」に変えても意味に変わりはない。
- 背が高い
- 身長が高い
翻訳不可能性
各言語の慣用表現は大抵その国の中で生まれ、慣用的に使われる表現であるため、単語一つ一つをそのまま翻訳すると意味が失われてしまう。
例えば、「猫舌」という表現を韓国語にそのまま翻訳してしまうと、「熱いものが苦手」という意味は失われ、「猫」の「舌」という意味だけが残る。
翻訳不可能性の例外
しかし、翻訳不可能性には例外が存在する。
例えば、特定の国の慣用表現が他の国に伝わったり、偶然一致する場合がある。
例えば、「口に上る」という表現は韓国語と中国語に訳しても同じ意味を持つ。
- 口に上る (日本語)
- 입에 오르다 (韓国語)
- 上口 (中国語)
また、翻訳借用(翻訳された表現)もある。
例えば、「鉄のカーテン」は、韓国語やルーマニア語にそのまま翻訳しても、1918年のヨーロッパの境界を意味する。これは「鉄のカーテン」という言葉が各言語にそのまま翻訳されて使われ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を翻訳借用と言う。
社会文化的要素
慣用表現にはその国の社会や文化が込められている。
例えば「同じ釜の飯を食う」という言葉には、むかし釜で飯を作った文化が込められている。
逆に、「zgârie-brânză」(チーズを削る:けちな人、ケチ)というルーマニア語の慣用表現にはチーズに慣れ親しんだヨーロッパの文化が反映されている。
最後にルーマニア語の慣用表見を紹介した動画で終わりにしたい。面白い表現がいっぱい載っているので、クイズだと思って解いてみよう。
https://www.youtube.com/watch?v=39Fam-sd7WU
参考文献
単行本
-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국어학회, 1999)
学術誌論文
- 황정남, 「한국어와 루마니아어의 비유적 관용어 비교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 19호, 2007.
- 김정환, 「유형과 형태로 본 루마니아 동물속담 분석」, 『외국문학연구』 제 41호, 2011.
- 엄태현, 「루마니아어와 한국어 속담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동유럽발칸연구』 제 12권 제 2호, 2004.
- 김정환, 「루마니아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과 민속학적 수용」, 『동유럽발칸연구』 제 39권 제 4호, 2015.
- 權益湖, 「일본어형 관용어 차용에 관한 小考」, 『일어일문학』 제 14권, 2000.
- 王雪瑶, 「慣用句の意味推測における透明度要因に関する一考察」, 『人間文化創成科学論叢』 第24巻, 2021.
学位論文
- 조승화, 「관용표현의 범주와 유연성」, (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Maria-Daniela Tudor, 「"WHAT DO YOU MEME?"-REPREZENTAREA VIZUALĂ A EXPRESIILOR IDIOMATICE ÎN MEMELE DE PE INTERNET」, (博士学位論文, University of Bucharest), 2022.
ウェブサイト
- Wikipedia, “idiom”(검색일 : 2022.06.08)
https://en.wikipedia.org/wiki/Idiom - Youtube, “15 ROMANIAN Sayings That Sound Really Funny In English” (検索日 : 2022.06.09)
https://www.youtube.com/watch?v=39Fam-sd7WU - SHITIU, “De unde vine expresia „teoria chibritului”?” (検索日 : 2022.06.10)
https://www.shtiu.ro/de-unde-vine-expresia-teoria-chibritului-107902.html - Primul in Moldova, “Voronin, către Spinu: Dă nasul in jos și apucă-te de lucru” ( 検索日 : 2022.06.11)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primul.md%2Fvoronin-catre-spinu-da-nasul-in-jos-si-apuca-te-de-lucru&psig=AOvVaw2Yu5jY9IarDVgzwJRtUCZw&ust=1655213558047000&source=images&cd=vfe&ved=0CAoQjhxqFwoTCLjIsZPFqvgCFQAAAAAdAAAAABAD - https://www.weblio.jp/content/慣用表現
- https://ameblo.jp/jam9blog/entry-11499456631.html